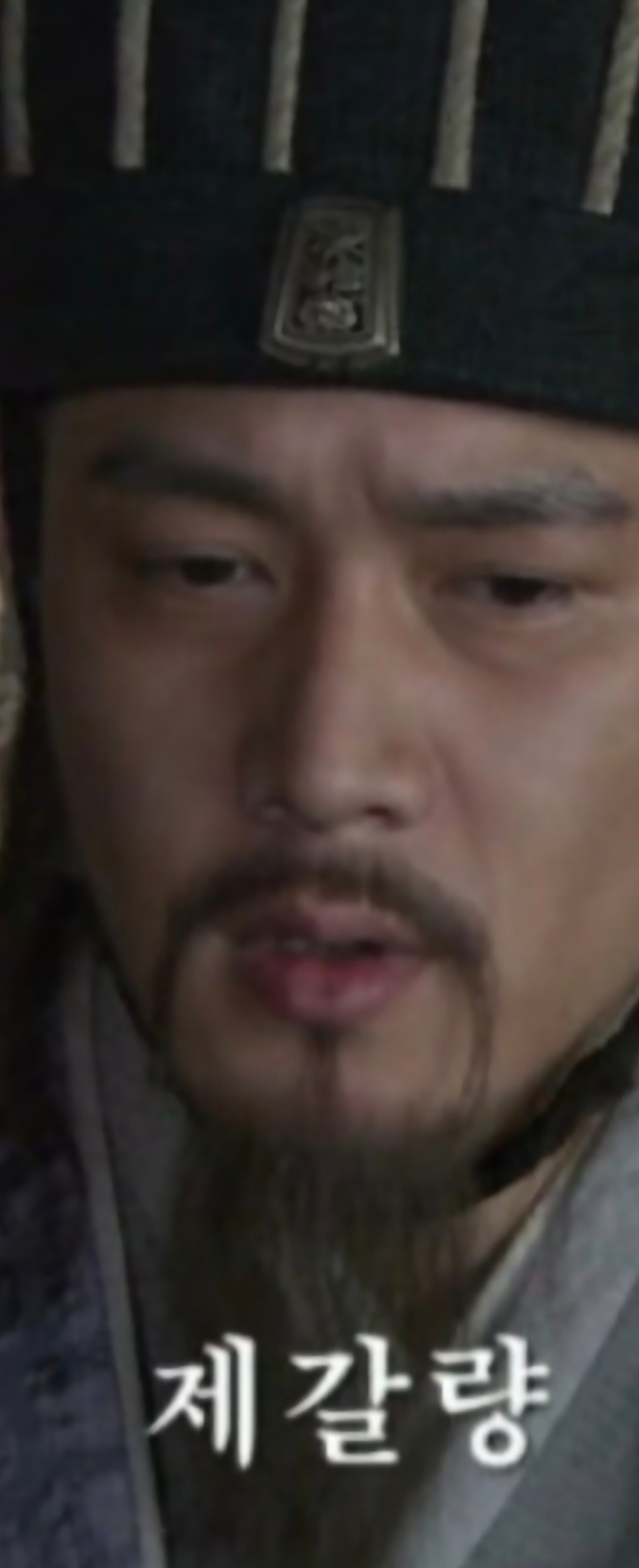
■
문학평론가 청람 김왕식과 함께 떠나는 삼국지 여행
제3ㅡ5회. 유비와 제갈량의 운명적 만남
― 삼고초려, 시대를 바꾸는 문 하나를 두드리다
형주를 떠나 남하한 유비는 조조의 추격을 피해 강하에 도달한다. 이때 유비는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완전히 잃은 상황이었다. 병력은 흩어졌고, 동맹은 끊겼으며, 몸을 의탁할 땅조차 불안정했다. 하지만 유비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 그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리하여 유비의 시선은 남양(南陽)의 은자, 제갈량(諸葛亮)에게 향한다. ‘와룡(臥龍)’이라 불리는 젊은 선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천하의 계책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했다. 공명(孔明)은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명성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유비는 그를 직접 찾아 나선다. 이것이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시작이다. 첫 번째 방문, 제갈량은 외출 중이었고, 유비는 문 앞에서 정중히 기다리다 돌아온다. 두 번째 방문도 헛걸음이었다. 유비의 신하들은 차라리 다른 책사를 데려오자고 조언했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세 번째 방문, 마침내 제갈량이 모습을 드러낸다. 유비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춘다. 그는 황실의 후손이었지만, 한 젊은 선비 앞에서 스스로를 낮췄다. 이 장면은 단지 책사 한 명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유비가 앞으로 어떤 정치철학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었다.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에 마음을 열고, 장문의 전략을 펼친다. 이른바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조조가 북방을 장악하고, 손권이 동남을 다스릴 때, 유비는 서쪽 익주를 발판 삼아 형주와 더불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 유비가 있어야 한다고 그는 단언했다.
그날 이후, 유비는 제갈량을 좌속으로 삼고 모든 군정과 국사를 의논했다. 관우와 장비조차도 제갈량 앞에서는 군령을 따랐다. 유비의 리더십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을 나누기보다는, 신뢰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길을 택한 것이다.
삼고초려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건, 유비가 한 시대의 방향을 전환한 출발점이었다. 땅도 군사도 없이, 사람 하나를 얻음으로써—그는 다시 천하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
■
제3ㅡ5회 삼국지 평
유비와 제갈량의 운명적 만남
■ 등장인물 특징
유비(劉備)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구한 인물. 삼고초려는 그의 진심을 상징한다. 천하를 얻기 위한 전략보다, 함께 걸어갈 이 한 사람을 얻는 데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힘보다 인재, 권력보다 신뢰를 먼저 본 군주였다.
제갈량(諸葛亮)
은둔의 선비에서 천하를 설계한 전략가로. 한 번의 만남으로 유비의 삶을 바꾸고, 삼국의 판도를 짰다. 그의 전략은 군사보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 있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칼이 아니라 머리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 자.
관우·장비
처음엔 제갈량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유비의 신뢰를 보며 그를 인정하게 된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유비의 리더십을 통한 설득의 결과다. 강한 힘 위에 놓인 신념의 전환점이었다.
■ 현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교훈
유비와 제갈량의 만남은 오늘날 조직과 사회에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유비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좋은 인재가 필요함을 알고, 그 인재를 얻기 위해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날 수많은 리더가 권위만 내세우다 인재를 잃는다. 그러나 유비는 진심으로 사람을 얻었다. 제갈량 또한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능력을 꺼냈다. 사람은 조건보다 마음에 움직이는 존재다. 이 회는 말한다. 진정한 만남은 힘 있는 자와 똑똑한 자 사이가 아니라, 절박한 자와 간절한 자의 교차에서 이루어진다고. 삼고초려는 리더십의 전범이며, 인재 경영의 영원한 교훈이다.
■ 삼국지 내용에서 아쉬운 점
삼고초려는 상징적 장면이지만, 제갈량의 내면적 고민이나 유비와의 철학적 교감은 다소 축소되어 있다. 왜 제갈량은 그 시기에 결단했는가? 유비의 어떤 점이 그를 움직였는가? 그 심리 묘사가 간결한 회고로 처리되어 깊은 공감이 부족하다. 또한 ‘천하삼분지계’의 담론은 전략적이나 정치철학적 해석 없이 단순한 전술 수준으로 지나간다. 유비와 제갈량, 두 사람의 대화가 인류 정치사에서 가지는 함의는 훨씬 깊은데, 서사적 구성은 이를 서둘러 전개해 여운을 줄인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인재 영입이 아니라, ‘시대를 건너는 철학의 선택’이었음을 더 천착했더라면 삼국지의 정점이 되었을 것이다.
ㅡ 청람
'청람과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죽음의 미학 ㅡ 사라짐이 남기는 빛 (0) | 2025.04.28 |
|---|---|
| 문학평론가 청람 김왕식과 함께 떠나는 삼국지 여행4ㅡ1 (0) | 2025.04.28 |
| 문학평론가 청람 김왕식과 함께 떠나는 삼국지 여행3ㅡ4 (0) | 2025.04.28 |
| 문학평론가 청람 김왕식과 함께 떠나는 삼국지 여행3ㅡ3 (1) | 2025.04.26 |
| 문학평론가 청람 김왕식과 함께 떠나는 삼국지 여행3ㅡ2 (0) | 2025.04.24 |



